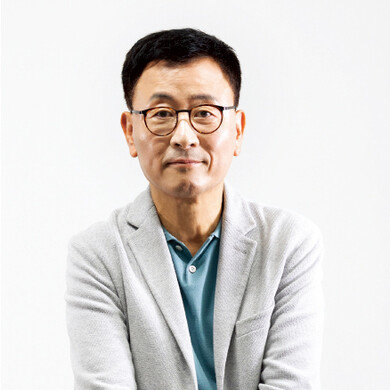이탈리아로 무작정 여행을 떠나고 싶은 가을이다. 나를 어여쁜 여인으로 봐주는 이탈리아 남자들의 눈빛이 마냥 그립기 때문이다. 방송사와 회사를 오가며 잘 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들 틈에서 생활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 난 더 이상 여자가 아니다. 가끔 한껏 멋을 부리고 나타나도 남자 동료들은 관심을 보이기는커녕 코웃음을 친다. 아~ 나의 미모를 한눈에 알아봐주는 이탈리아로 지금 당장 떠나고 싶다. 팽팽하고 날씬했던 스물다섯 살로 돌아가 이탈리아 노천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를 훑고 지나가는 무수한 시선들을 즐기고 싶다.
“아침 방송에서는 잘 생긴 남자 파트너들을 요일마다 바꿔가며 출연하고 회사에는 온통 젊은 남자 기자들뿐이니 좋으시겠어요.”
MBC ‘아주 특별한 아침’에는 일주일에 2~3번 중앙일보 의학전문 기자 홍혜걸씨, 명지대 신률 교수와 함께 출연하고, 일터에서는 20명 가까운 남자 후배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다보니 종종 이런 부러운(?) 시선을 받는다.
물론 아름답고 섹시한 여성들 사이에서 좌절감에 몸부림치는 것보다야 잘생기고 똑똑한 남자들과 더불어 일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그런 남자들 사이에서 꽃처럼 돋보이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남자 취급을 받는다는 게 문제다. 함께 방송에 출연하는 두 남성은 매너도 좋고 목소리도 근사하다. 하지만 서로 너무 바빠 방송이 끝나면 ‘휘리릭’ 사라져버린다.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난 ‘여자’가 아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이다.
파인 옷 입고 새빨간 립스틱 발라도 여자 취급 못 받는 서러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직장 후배들은 여자 데스크가 처음이어서인지 약간 긴장도 하고 신경도 써주는 듯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지금은 내가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건 향수를 뿌리건 아무런 관심이 없다. 목이 유난히 짧고 굵어서 목이나 가슴 부분이 드러나는 옷을 즐겨 입는데(특별한 의도는 없다. 다만 목을 잠그는 옷은 답답해서일 뿐) “어머어머, 그렇게 파인 옷을 입으면 남자 동료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하고 고마운 걱정을 해주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정작 나의 동료들은 내가 갑옷을 입고 있는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의식도 안 하고 씩씩하게 일만 잘한다. 아니 내가 남자 화장실에 척 들어서도 별로 놀랄 것 같지 않다.
가끔 내가 여자란 걸 주장하면 오히려 비웃는다. 얼마 전에 끝난 ‘파리의 연인’에서 김정은은 자기를 못생겼다고 구박하는 박신양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유, 다른 애인들처럼 이런 말 좀 해봐요. ‘예쁜 게 죄라면 넌 총살형(종신형이던가?)이다’라거나 ‘너 도둑이지? 안 그러면 네 눈 속에 박힌 그 보석은 어디서 훔쳐온 거야?’라거나.”
오래된 농담이지만 재미있어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니 직장 후배들이 그랬다. “글쎄… 유 부장은 미모가 죄라면 구류 3일 정도나 될까?” 차라리 훈방이 낫지 졸렬하게 구류 3일이 뭔가.
이럴 때 나는 문득 이탈리아로 떠나고 싶어진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예쁜지 못생겼는지 아무 관심도 없지만 이탈리아 남자들은 혼자 있는 여자를 절대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말을 걸거나 음료수를 사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윙크라도 해주는 친절과 자비심(?)을 베푼다. 그래서 독일의 독신 여성들은 생활이 너무 건조해 정체성에 의심이 들면 이탈리아로 날아가 노천카페에 앉아서 이탈리아 남성들이 보내는 눈길을 즐기고 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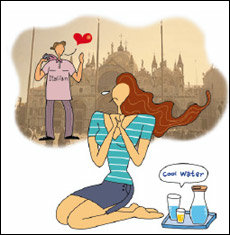
나는 스물다섯 살 때 이탈리아에 처음 가봤다. 물론 지금보다 훨신 젊고 날씬하고 팽팽했던 시절이다. 혼자 노천카페에서 차를 마시는데 옆자리에 앉아 있던 남자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았다. 끈적끈적한 눈빛이 내 몸을 엑스레이 찍듯 훑는 것 같았다. 은근히 신경 쓰이긴 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음, 난 역시 국제적 수준이고 수출용인가봐. 내수 시장에선 각광을 못 받아도 해외에 나오니 드디어 내 미모가 인정받고 빛을 발하네. 저 이탈리아 남자의 눈빛 좀 봐.’
그런 착각도 잠시. 슬쩍 눈을 들어보니 그 남자, 나를 보는 시선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에 그런 눈빛을 던지고 있었다. 지나가는 강아지는 물론 테이블 위에 놓인 글라스 등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실망하긴 했지만 거리의 과일장사 아저씨며 묵고 있던 호텔의 종업원들까지 모두 휘파람을 불고 윙크를 해주어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또 파리로 가기 위해 밀라노역에서 기차를 기다릴 때도 한 아저씨가 나에게 “착해 보여 저녁을 사주고 싶다”고 해서 제법 근사한 식당에서 밥도 얻어먹고 두오모 성당 모양의 스탠드 선물까지 받은 뒤 무사히 기차에 올라탔다.
윙크하며 밥까지 사주는 이탈리아 남자들의 친절함 그리워
몇 년 전 이탈리아의 고풍스런 도시 비첸차에 출장을 갔을 때도 그랬다. 세계적인 규모의 보석전시회가 열렸는데 행사장이 너무 크고 복잡해 일행과 떨어져 잠시 쉬고 있을 때였다. 몇 명의 이탈리아 남자들이 다가오더니 “너 참 예쁘다”고 했다(적어도 내가 해석한 이탈리아어로는 그랬다). 마흔 넘어 들은 찬사여서 마냥 행복했지만 우아한 척 짐짓 무시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가이드가 다가와 대화가 끊겼다.
“뭐 하고 계세요?” “응, 저 아저씨들이 나보고 예쁘다는군요.” 그러자 가이드는 “쟤네들, 동양 여자들 보면 다 그렇게 호감을 표해요. 더구나 여기 보석전시장에 온 여자들은 돈도 많을 것 같으니 유혹하는 걸 거예요. 이탈리아에는 도둑도 많고 집시도 많거든요.”
황홀함은 잠시, 난 그 후 핸드백을 내내 움켜쥐고 다녔지만 솔직히 그들이 어떤 의도로 그랬건 “벨라!”라고 해준 찬사를 믿고 싶었다. 카사노바면 어떻고 집시면 어떤가, “아름답다”는 말 한마디는 잠시나마 내가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신비의 명약인걸. 그래서 그동안 여행했던 수많은 나라 중 그 어떤 나라보다 이탈리아가 아름답고 근사하게 기억되는지도 모른다.
너무 바쁘기도 하고,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아 당장 이탈리아로 떠나기는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이 가을, 난 협박을 해서라도 ‘예쁘다’ ‘멋지다’란 말을 듣고 싶다. 딸아이에게 “얘 , 엄마는 넘치는 지성미 때문에 미모가 너무 가려지는 것 같지 않냐? 아, 고민이다”라고 했더니 딸아이가 점잖게 말했다.
“엄마, 엄마가 자꾸 그러면 나까지 욕을 먹는다고.”
나이 들면 딸이 스승이다. 주제 파악하고 고전이나 읽어야겠다.
-
추천 0
-
댓글 0
- 목차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