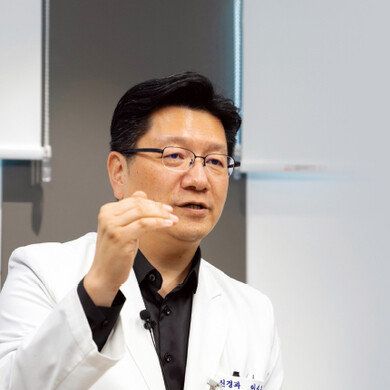제39회 최은희 여기자상을 수상한 동아일보 이진영(54) 논설위원. 수많은 좌절과 시행착오를 겪은 그에게 이번 상은 ‘그동안 성실하게 잘 살아왔다’고 토닥여주는 격려다. 이 위원은 올해 기자 생활 30주년을 맞았다. “주니어 때 상을 받았다면 제가 잘나서 받은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이 들어가며 빚쟁이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죠. 다양한 취재원들과 동료 선후배 기자들 틈에서 좋은 자극을 받으며 일했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최은희 여기자상은 일제강점기인 1924년부터 8년 동안 우리나라 최초의 여기자로 활동하며 여권 신장에 앞장섰던 추계(秋溪) 최은희(1904~1984) 선생이 기탁한 기금으로 1984년 제정됐다. 이 위원은 설문조사, 참여관찰, 포커스그룹인터뷰(FGI) 등 사회과학 방법론을 활용해 여성·환경·교육·문화·국제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해왔다.
1993년 10월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문화부·국제부 등을 거쳐 언론사 최초로 시도한 주말판 위크엔드 창간 멤버로 활약했고, 채널A 심의실장을 지냈다. 현재는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사설과 ‘횡설수설’ ‘오늘과 내일’ 칼럼을 쓰고 있다.
소심함이 만든 완벽함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회 최은희 여기자상 시상식.
“취재원들이 대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남자들이었죠. 몇 명 없는 여기자라고 특별히 챙겨주는 취재원들도 있었지만, 남자 기자들에 비해 취재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는 불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위원에게 “기자로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지금도 아침마다 경쟁 신문을 보고 물 먹은 게 뭔지, 같은 주제의 사설이나 칼럼을 나보다 더 잘 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공포스럽다”고 답했다.
‘물 먹는다’는 표현은 낙종, 즉 특종을 놓쳤다는 언론계 용어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열등감은 항상 그를 공부하게 채찍질했고, 어려운 취재 앞에서 전전긍긍하던 소심함은 그를 누구보다 부지런한 기자로 만들었다.
“저는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 ‘못해내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큰 편이에요. 이게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계획을 세우고, 많이 취재하고, 마감시간을 어길까봐 미루지 않고 기사를 쓰게 되죠.”
한 회사에서 길러온 인생 맷집
사건 현장에 경찰과 구급차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기자다. 그는 “사건 사고가 막 벌어지기 시작한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건의 성격을 규정해내는 일이 어려웠다”고 했다. 더욱이 요즘처럼 속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사실 검증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그럴듯한 제보 내용도 자세히 따져보면 엉터리인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동영상도 조작이 가능한 시대잖아요. 남들보다 빨리 보도하기보다 늦더라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은 최근 일어난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비상시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그 매뉴얼대로 조직이 운영되는지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다고 했다.
“이번 참사에서는 경찰 수뇌부의 공백 상태가 있었어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을까 놀랐습니다. 언론사만 해도 매일 야근 국장과 부장, 차장, 당직 기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밤새 놓치는 사건 사고가 없는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일하죠. 큰 일이 터지면 비상 연락망이 가동되고 매뉴얼에 따라 취재하고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신문을 만듭니다. 일상 속에서 이런 ‘기본’을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30년 한 조직에서 머물면서 위기의 순간도 많았다. 특히 젊은 시절엔 막연하게 화려한 미래를 꿈꿨는데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이 견디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내가 주인공이 될만한 재능도 없고, 엄청난 성공을 기대하기엔 더 이상 젊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남보다 주목받고 남보다 잘 해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최고는 아니지만 30년간 쉬지 않으며 써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대단한 무언가가 되진 못하겠지만 제 글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최은희여기자상 #이진영논설위원 #여성동아
사진 조영철 기자
사진제공 최은희 여기자상 운영위원회
-
추천 0
-
댓글 0
- 목차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