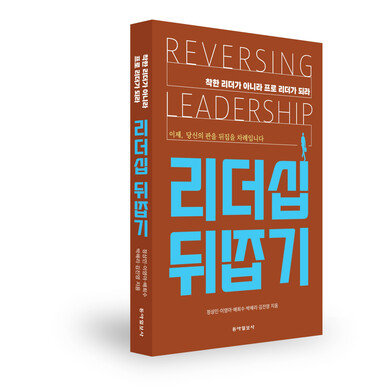김주연(32, 서울시 강동구 성내1동)
![친정 엄마에 대한 감동사연 공모 당선작 [최우수상]-김주연](https://dimg.donga.com/egc/CDB/WOMAN/Article/20/05/07/15/200507150500010_1.jpg)
드높은 하늘을 향해 봄꽃들이 무리 지어 미소를 보내는 좋은 날이다. 오늘 같은 날은 엄마도 친구분들과 꽃구경도 가고 맛난 음식도 사 드시는 엄마만을 위한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전히 뜨거운 기름 앞에서 닭을 튀기고 쌓인 설거지를 하고 계실 엄마를 생각하니 이 좋은 봄볕을 쬐는 것도 죄송스럽기만 하다.
오늘 문득 집안을 정리하다 편지 꾸러미를 발견했다. 그 많은 편지 속에 유일하게 꼬깃꼬깃 접힌 쪽지 하나가 보였다. 십 년 전에 엄마가 내게 주신 편지였다. 그 쪽지엔 엄마의 고생과 자식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도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자식 4남매 잘 키워보시겠다고 비좁은 방에다 콩나물을 손수 길러 시장바닥에 앉아 파시기도 했고, 갖가지 반찬을 만들어 파시기도 했다.
시장바닥에서만 그러시기를 7년. 내가 스무 살이었을 때 두 평도 채 안되는 작은 분식집을 하셨다. 전철역 근처라 늦게까지 오는 손님들이 많아 새벽 2시까지는 라면 배달도 하고 김밥도 말아 팔아야만 했다. 한번은, 라면 다섯 그릇 배달이 있어서 커다란 은쟁반을 머리에 얹고 당구장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려는데 갑자기 1층 호프집에서 친구들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 시간 술 한 잔을 함께할 여유가 있는 그 친구들이 몹시 부럽기도 했고, 또 라면을 머리에 이고 있는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어머, 주연이잖아. 너 괜찮아? 오늘 약속 있다며?”
“어….”
엎어진 쟁반과 흩어진 라면 건더기를 보면서 차마 약속이 있다던 내 입장을 떳떳이 밝히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다. 갓 끓은 라면이 엎어지면서 다리에 닿았는지 바지는 딱 달라붙고 후끈후끈 따갑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여기저기 굴러떨어진 그릇들을 모아주고, 휴지를 꺼내어 내 팔과 다리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솔직히 그 순간 고마운 마음보다는 창피한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다. 불어터진 라면 건더기를 담아 포갠 그릇들을 이고서 다시 가게 앞에 와 섰는데 엄마에게 혼날 것만 같아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방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엄마가 들어오시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엄마는 행여나 내가 깨기라도 할까봐 조심스레 들어와 이부자리를 펴고 나를 찬찬히 누이셨다.
엄마에게선 여전히 익숙한 라면 냄새가 났다. 씻어도 씻어도 깊숙이 배인 그 냄새는 사라질 줄 모르고, 손님들이 먹다 남은 라면 그릇을 씻으려면 그 뻘건 기름기는 왜 그리도 안 닦이던지…. 누가 엄마에게선 항상 고운 냄새만 난다고 했던가. 사실 가게에서 일하시면서 배인 온갖 냄새들로 내 기억 속엔 엄마 냄새는 따로 없었던 것 같다.
엄마는 내 이마를 한 번 쓰다듬고는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내 다리를 만지고 또 만지셨다. 그리곤 한참을 숨죽여 우셨다. 엄마의 그 눈물을 만져 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뜨겁고 가슴 쓰라리셨는지는 느낄 수 있었다. 시집오기 전날 밤에도 엄마는 내 다리에 남은 상처를 보고는 눈물을 적시셨다. 목이 메여 차마 괜찮다는 말씀도 못 드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고생들이 있었다는 게 나로선 감사할 따름이다. 몇 년째 이렇게 살기 빠듯한데도 내 엄마처럼 나 역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이다.
엄마의 쪽지 편지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뒤늦은 후회 밀려와
그날 밤 엄마의 슬픈 모습을 보고 난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엄마께서는 전날 팔다 남은 김밥을 싸주셨다. 여느 때 같으면 또 김밥이냐며 안 가져간다고 못난 투정을 부렸을 텐데 그냥 말없이 가방에 넣고는 집을 나왔다. 점심 무렵 김밥주머니를 열어보았다. 그 안엔 팔다 남은 김밥보다도 더 꼬깃해 보이는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내 사랑하는 딸 보거라. 십 년 전 겨울 널 처음 서울로 데리고 왔을 때가 생각난다. 또래 친구들은 옷도 잘 입고 학용품도 잘 사고 그러는데 넌 사라고 돈을 줘도 이 엄마 생각해서 몽당연필이 될 때까지 쓰고 지우개도 친구들이 쓰던 거 모아서 뭉쳐 쓰곤 했지. 지금도 얼마나 절약하며 생활하는지 다 안다. 네 나이 스무 살이나 됐는데도 늘 네 시간도 없이 배달만 시키고 설거지만 시켜서 미안하구나. 어디 다친 덴 없니? 많이 놀랐지? 너 김밥 싫어하는데 또 싸줘서 미안하다. 오늘은 일찍 와라. 우리 딸 좋아하는 닭 사줘야겠다. 엄만 네가 참 든든하고 사랑스럽단다. 공부 열심히 하거라. 엄마가.”
눈물이 뚝뚝 허벅지 위를 적셨다. 친구들은 왜 그러냐고 자꾸만 물어보는데 목구멍까지 눈물이 올라와서 차마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 늦은 밤에 이 딸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얼마나 마음을 꼭꼭 눌러 쓰셨는지 삐뚤삐뚤 맞춤법도 틀린데다 중간엔 눈물자국마저 있는 게 내겐 그 어떤 편지보다도 소중했다. 엄마께 미안한 마음에 김밥도 제대로 넘어가질 않았다. ‘배달만 하고 설거지만 해서 집에 오는 게 싫다’고 철없이 내뱉었던 말들이 생각난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못할 줄 알았다면 그때 기쁜 마음으로 해드릴 걸 하는 후회의 눈물과 함께 마음이 아파온다.
방 한 칸에서 6명이 발이 섞여서 자고, 여름이면 장마로 집에 물이 가득 차서 고생하고 겨울엔 난방이 안돼 두둑한 이불을 겹겹이로 덮고 자야 했던 지난날. 먹을 거 못 드시고 잠 한숨 편히 못 주무시면서도 오로지 자식들 뒷바라지에만 평생을 사셨는데 3년 전 가족들의 기대와는 달리 조카가 선천성 녹내장과 심장기형을 갖고 태어났다. 친할머니라고 조카를 품에 안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다니시며 의사들에게 두 무릎을 꿇고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던 엄마가 생각난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한숨으로 밥을 대신했던 때였다.
벌써 2년도 더 지났는데도 엄마의 눈물은 여전히 마를 기미가 안 보인다. 몇 차례 수술도 했건만 여러 군데가 다 안 좋아서 고생하는 손자녀석을 보시고 어찌 환히 웃을 수가 있으실까. 거기다 작년엔 둘째 손자까지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는 마음 아픈 일도 겪으셨다. 지금까지의 고생보다도 더한들 손자녀석만 앞을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신 엄마 말씀이 오늘은 더더욱 가슴 아프다.
내 앞에선 목 놓아 울던 한없이 약한 엄마이면서도 새언니와 오빠가 낙심할까봐 “장애는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분명 장애를 보듬을 만한 큰 그릇이 되기 때문에 온 것”이라며 격려해주는 강한 분이 바로 내 어머니다. 손자녀석 수술비라도 보태야 하신다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새벽에도 설거지며 청소며 마다 않고 고생하시는 엄마를 생각하면 정말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알게 된다. 조카도 분명 그 간절한 마음 알아서 앞으로 있을 많은 수술도 잘 이겨내고 눈도 좋아질 거라 믿는다.
재작년 남편은 십 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일을 시작했다. 벌써 쌀이며 김치를 가져다 먹은 지도 꽤 되었다. 괜찮다고 해도 바리바리 싸주시는 엄마를 보면 나도 나중에 그런 엄마가 될 것만 같다. 그게 엄마가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엄만 너희들 때문에 산다”는 말이 전에는 버겁고 부담스럽기만 했는데 어미가 되고 보니 이해가 가고 고맙기만 하다. 자식이 자신보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자식이 순탄하게 잘되기만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왜 이제야 알게 됐는지…. 늦었지만 정말로 눈물나도록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장사라면 진절머리가 난다면서도 오로지 자식들 생각에 이 악물고 일만 하실 엄마. 식사도 잠도 제때 하지 않아 지금은 위장병에 관절염으로 약을 달고 살고 온몸에 파스를 붙여도 개운치 않은 엄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시다.
지금에서야 내 엄마에게서도 냄새가 난다는 걸 깨달았다. 미처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냄새가 말이다. 주저 없이 바람 없이 아낌없이 베푸는 정성과 사랑으로 빚어진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냄새다. 난 엄마의 냄새가 참 좋다. 차마 쑥스러워 하지 못한 말. 이제야 엄마께 전하고 싶다. “엄마! 눈물겹도록 고맙고 사랑해요.”
![친정 엄마에 대한 감동사연 공모 당선작 [최우수상]-김주연](https://dimg.donga.com/egc/CDB/WOMAN/Article/20/05/07/15/200507150500010_1.jpg)
드높은 하늘을 향해 봄꽃들이 무리 지어 미소를 보내는 좋은 날이다. 오늘 같은 날은 엄마도 친구분들과 꽃구경도 가고 맛난 음식도 사 드시는 엄마만을 위한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전히 뜨거운 기름 앞에서 닭을 튀기고 쌓인 설거지를 하고 계실 엄마를 생각하니 이 좋은 봄볕을 쬐는 것도 죄송스럽기만 하다.
오늘 문득 집안을 정리하다 편지 꾸러미를 발견했다. 그 많은 편지 속에 유일하게 꼬깃꼬깃 접힌 쪽지 하나가 보였다. 십 년 전에 엄마가 내게 주신 편지였다. 그 쪽지엔 엄마의 고생과 자식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너무나도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자식 4남매 잘 키워보시겠다고 비좁은 방에다 콩나물을 손수 길러 시장바닥에 앉아 파시기도 했고, 갖가지 반찬을 만들어 파시기도 했다.
시장바닥에서만 그러시기를 7년. 내가 스무 살이었을 때 두 평도 채 안되는 작은 분식집을 하셨다. 전철역 근처라 늦게까지 오는 손님들이 많아 새벽 2시까지는 라면 배달도 하고 김밥도 말아 팔아야만 했다. 한번은, 라면 다섯 그릇 배달이 있어서 커다란 은쟁반을 머리에 얹고 당구장으로 향했다. 계단을 오르려는데 갑자기 1층 호프집에서 친구들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 시간 술 한 잔을 함께할 여유가 있는 그 친구들이 몹시 부럽기도 했고, 또 라면을 머리에 이고 있는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어머, 주연이잖아. 너 괜찮아? 오늘 약속 있다며?”
“어….”
엎어진 쟁반과 흩어진 라면 건더기를 보면서 차마 약속이 있다던 내 입장을 떳떳이 밝히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다. 갓 끓은 라면이 엎어지면서 다리에 닿았는지 바지는 딱 달라붙고 후끈후끈 따갑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여기저기 굴러떨어진 그릇들을 모아주고, 휴지를 꺼내어 내 팔과 다리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솔직히 그 순간 고마운 마음보다는 창피한 마음이 더 들었던 것 같다. 불어터진 라면 건더기를 담아 포갠 그릇들을 이고서 다시 가게 앞에 와 섰는데 엄마에게 혼날 것만 같아 도저히 들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방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엄마가 들어오시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엄마는 행여나 내가 깨기라도 할까봐 조심스레 들어와 이부자리를 펴고 나를 찬찬히 누이셨다.
엄마에게선 여전히 익숙한 라면 냄새가 났다. 씻어도 씻어도 깊숙이 배인 그 냄새는 사라질 줄 모르고, 손님들이 먹다 남은 라면 그릇을 씻으려면 그 뻘건 기름기는 왜 그리도 안 닦이던지…. 누가 엄마에게선 항상 고운 냄새만 난다고 했던가. 사실 가게에서 일하시면서 배인 온갖 냄새들로 내 기억 속엔 엄마 냄새는 따로 없었던 것 같다.
엄마는 내 이마를 한 번 쓰다듬고는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내 다리를 만지고 또 만지셨다. 그리곤 한참을 숨죽여 우셨다. 엄마의 그 눈물을 만져 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뜨겁고 가슴 쓰라리셨는지는 느낄 수 있었다. 시집오기 전날 밤에도 엄마는 내 다리에 남은 상처를 보고는 눈물을 적시셨다. 목이 메여 차마 괜찮다는 말씀도 못 드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고생들이 있었다는 게 나로선 감사할 따름이다. 몇 년째 이렇게 살기 빠듯한데도 내 엄마처럼 나 역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이다.
엄마의 쪽지 편지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뒤늦은 후회 밀려와
그날 밤 엄마의 슬픈 모습을 보고 난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엄마께서는 전날 팔다 남은 김밥을 싸주셨다. 여느 때 같으면 또 김밥이냐며 안 가져간다고 못난 투정을 부렸을 텐데 그냥 말없이 가방에 넣고는 집을 나왔다. 점심 무렵 김밥주머니를 열어보았다. 그 안엔 팔다 남은 김밥보다도 더 꼬깃해 보이는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내 사랑하는 딸 보거라. 십 년 전 겨울 널 처음 서울로 데리고 왔을 때가 생각난다. 또래 친구들은 옷도 잘 입고 학용품도 잘 사고 그러는데 넌 사라고 돈을 줘도 이 엄마 생각해서 몽당연필이 될 때까지 쓰고 지우개도 친구들이 쓰던 거 모아서 뭉쳐 쓰곤 했지. 지금도 얼마나 절약하며 생활하는지 다 안다. 네 나이 스무 살이나 됐는데도 늘 네 시간도 없이 배달만 시키고 설거지만 시켜서 미안하구나. 어디 다친 덴 없니? 많이 놀랐지? 너 김밥 싫어하는데 또 싸줘서 미안하다. 오늘은 일찍 와라. 우리 딸 좋아하는 닭 사줘야겠다. 엄만 네가 참 든든하고 사랑스럽단다. 공부 열심히 하거라. 엄마가.”
눈물이 뚝뚝 허벅지 위를 적셨다. 친구들은 왜 그러냐고 자꾸만 물어보는데 목구멍까지 눈물이 올라와서 차마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 늦은 밤에 이 딸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얼마나 마음을 꼭꼭 눌러 쓰셨는지 삐뚤삐뚤 맞춤법도 틀린데다 중간엔 눈물자국마저 있는 게 내겐 그 어떤 편지보다도 소중했다. 엄마께 미안한 마음에 김밥도 제대로 넘어가질 않았다. ‘배달만 하고 설거지만 해서 집에 오는 게 싫다’고 철없이 내뱉었던 말들이 생각난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못할 줄 알았다면 그때 기쁜 마음으로 해드릴 걸 하는 후회의 눈물과 함께 마음이 아파온다.
방 한 칸에서 6명이 발이 섞여서 자고, 여름이면 장마로 집에 물이 가득 차서 고생하고 겨울엔 난방이 안돼 두둑한 이불을 겹겹이로 덮고 자야 했던 지난날. 먹을 거 못 드시고 잠 한숨 편히 못 주무시면서도 오로지 자식들 뒷바라지에만 평생을 사셨는데 3년 전 가족들의 기대와는 달리 조카가 선천성 녹내장과 심장기형을 갖고 태어났다. 친할머니라고 조카를 품에 안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다니시며 의사들에게 두 무릎을 꿇고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던 엄마가 생각난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한숨으로 밥을 대신했던 때였다.
벌써 2년도 더 지났는데도 엄마의 눈물은 여전히 마를 기미가 안 보인다. 몇 차례 수술도 했건만 여러 군데가 다 안 좋아서 고생하는 손자녀석을 보시고 어찌 환히 웃을 수가 있으실까. 거기다 작년엔 둘째 손자까지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는 마음 아픈 일도 겪으셨다. 지금까지의 고생보다도 더한들 손자녀석만 앞을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신 엄마 말씀이 오늘은 더더욱 가슴 아프다.
내 앞에선 목 놓아 울던 한없이 약한 엄마이면서도 새언니와 오빠가 낙심할까봐 “장애는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분명 장애를 보듬을 만한 큰 그릇이 되기 때문에 온 것”이라며 격려해주는 강한 분이 바로 내 어머니다. 손자녀석 수술비라도 보태야 하신다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새벽에도 설거지며 청소며 마다 않고 고생하시는 엄마를 생각하면 정말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알게 된다. 조카도 분명 그 간절한 마음 알아서 앞으로 있을 많은 수술도 잘 이겨내고 눈도 좋아질 거라 믿는다.
재작년 남편은 십 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일을 시작했다. 벌써 쌀이며 김치를 가져다 먹은 지도 꽤 되었다. 괜찮다고 해도 바리바리 싸주시는 엄마를 보면 나도 나중에 그런 엄마가 될 것만 같다. 그게 엄마가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엄만 너희들 때문에 산다”는 말이 전에는 버겁고 부담스럽기만 했는데 어미가 되고 보니 이해가 가고 고맙기만 하다. 자식이 자신보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자식이 순탄하게 잘되기만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왜 이제야 알게 됐는지…. 늦었지만 정말로 눈물나도록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장사라면 진절머리가 난다면서도 오로지 자식들 생각에 이 악물고 일만 하실 엄마. 식사도 잠도 제때 하지 않아 지금은 위장병에 관절염으로 약을 달고 살고 온몸에 파스를 붙여도 개운치 않은 엄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시다.
지금에서야 내 엄마에게서도 냄새가 난다는 걸 깨달았다. 미처 알지 못했던 아름다운 냄새가 말이다. 주저 없이 바람 없이 아낌없이 베푸는 정성과 사랑으로 빚어진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냄새다. 난 엄마의 냄새가 참 좋다. 차마 쑥스러워 하지 못한 말. 이제야 엄마께 전하고 싶다. “엄마! 눈물겹도록 고맙고 사랑해요.”
-
추천 0
-
댓글 0
- 목차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