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화요일, 공부방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다. 오후 2시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화요일이면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하다. 옷도 조금 더 환한 색을 고르게 되고, 잠깐이나마 머리도 묶을까 말까 고민하게 된다.
강북구 수유동에 자리 잡은 ‘마을속작은학교’에서 17명의 아이들과 함께 한 지도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이곳은 빈곤층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공간이다. 이곳 아이들은 오전엔 학교에서 보호를 받으며 공부하지만 방과후에는 부모가 일하러 나간 탓에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에 다니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부모가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까지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학습지도하는 일을 한다. 나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봉사를 하고 있다.
2시가 조금 안 된 시각, 공부방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료 선생님들이 “안녕하세요?” 하며 환한 얼굴로 반긴다. 미처 반갑다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일찌감치 와 있던 혜령이(9)가 달려와 품에 안긴다.
“어! 선생님 오늘 머리 안 묶으셨네요?”
“응, 혜령인 이제 안 아파?”
“네, 다 나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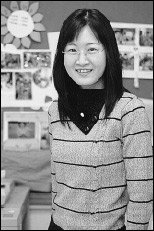
지난주에 봤을 때 열이 있는데다 코를 훌쩍거려 마음에 걸렸는데 다 나았다니 마음이 놓인다. 아이들 형편을 아는지라 감기라도 앓는 아이를 보면 안쓰러운 마음에 그냥 지나쳐지지 않는다.
2시가 넘자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개구쟁이 민규(11)와 재현이(11)는 들어서자마자 씨름을 한다고 난리다. 이제 아이들을 제자리에 앉히고 ‘잔소리쟁이 엄마’ 역할을 해야 할 시간이다.
“알림장 꺼내서 선생님 보여주기, 어서! 그리고 숙제 시작하자.”
숙제를 시작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인다.
“지구가 제일 커.” “아냐, 우주가 제일 커. 선생님,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인 영현이(8)와 철환이(8)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다. 그때 소현이(9)가 달려와 네 변의 길이를 같게 하려면 어떻게 도형을 잘라야 하는지 묻는다. 요즈음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많다. 때문에 원래 내가 맡은 과목인 영어만 가르칠 순 없다. 아이들 수에 비해 선생님이 모자라기 때문에 만물박사여야 하는 때도 많다.
숙제를 먼저 마친 아이들이 곁으로 와서 내 머리를 만지작거린다.
“선생님, 제가 머리 묶어드릴게요.”
“아냐, 선생님은 안 묶는 게 더 예뻐. 다음주에도 묶지 말고 오세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한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는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에게 부릴 응석을 선생님들에게 부리곤 한다. 날이 가면 갈수록, 아이들과의 거리감이 좁혀지면 질수록 공부 외에도 아이들의 마음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가장 마음이 쓰이는 것은 소외감의 문제다. 얼마 전 3학년인 연경이(10)가 종일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학교에서 작문 시간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다. 엄마에 대한 느낌을 시로 쓰는 날이었는데 엄마 없이 할머니와 둘이 사는 연경이는 작문 시간 내내 울기만 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며 다른 아이들에겐 공기처럼 당연한 것들이 이곳 아이들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근처 아파트 놀이터에 갔다가 쫓겨난 일이 있었다. 경비원은 아파트 거주자가 아니니 놀이터에서 놀 수 없다고 했다. 텅 비어 있는데도 말이다.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으며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도 있지만 그래도 화요일이면 즐거운 긴장감에 빠지는 것은 그만큼 행복감에 젖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지난 학기의 일이다. 학기가 끝나면 우리 공부방에서는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각자의 편지함을 만든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편지에 담아 서로에게 보낸다.
당시 나는 생각했던 것만큼 아이들이 내게 쉽게 다가오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때 희경이(11)가 보내온 편지와 과자 한 봉지에 눈물을 쏟고 말았다. 편지에는 아주 정성스러운 글씨로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흔하디흔한 말이다. 5백원짜리 과자 한 봉지도 요즘 아이들에겐 캐릭터 스티커를 위해 산 후 먹지 않고 버릴 수도 있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희경이는 말수가 없는 아이고, 더욱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평소 부모에게 과자 한봉지 사달라고 조르지 않는 아이라는 걸 알기에 그의 편지와 과자 한 봉지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먹고 학습지 검사까지 하고 나니 4시간이 후딱 지나갔다.
“선생님이 다음주 화요일에 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누가 가장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저요!” “저요!”
기분 좋은 아우성이다. 밝게 대답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내 마음도 밝아진다. 처음엔 “반은 남을 위해, 반은 나를 위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한 자원봉사. 하지만 매주 화요일 ‘한나절의 외출’도 결국 나를 위한 것은 아닐까. 훗날 태어날 나의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좀 더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말이다.
-
추천 0
-
댓글 0
- 목차
-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