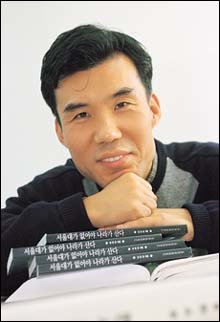
밖의 날씨는 매서웠지만 김동훈 교수(43, 국민대 법대)의 아담한 연구실은 창에 부딪치는 오후 햇살로 인해 유난히 따사로운 느낌이다. 맘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얼굴에 소박한 점퍼 차림으로 털털한 인상을 풍기는 김교수. 목소리도 인상만큼 부드럽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꼬집어 나가는 말투는 단호했다.
“지난핸가요? 한 젊은이가 수능시험에서 3백90점이 넘는 고득점으로 명문 사립대 인기학과에 특차 합격하고도 서울대 못 간 것을 비관하여 자살한 일이 있었죠. 사람들은 이 학생을 ‘서울대 편집증’ 환자로 몰아붙일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 학생은 우리 사회의 왜곡된 가치관이 만들어낸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김교수는 현재 우리의 중등교육 현장은 상업화한 스포츠대회나 투기화한 주식시장과 다름없다고 했다. 서울대는 금메달, 연고대는 은메달… 이런 식의 메달 경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육풍토 속에 금메달을 따지 못한 학생은 곧 패배자라는 이름으로 평생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얼마전 평소 알고 지내던 교수와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 과외비로 한달에 1백50만원을 지출한다더군요. 교수 월급에 비하면 만만치 않은 액수죠. 뼈빠지게 벌어서 과외선생들의 배만 불린다며 자기도 서울대를 나왔지만 서울대는 없어져야 한다고 푸념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내색을 안하지만 그분 아이의 목표 대학은 결국 서울대였어요.”
도대체 서울대가 뭐길래…. 식사를 마친 후 김교수는 대형서점 사이트에 들어가 도서 검색을 하던 중 동료 교수의 말이 생각나 ‘서울대’를 입력했더니 제목에 서울대가 들어간 책이 50~60권이 뜨더라는 것. 순간 그는 기가 막혔다고 한다. 대부분의 책들이 <서울대를 꿈꾸는 중학생들이 알아야 할 57가지> <서울대 합격생, 나만의 수능 고득점 노트> <서울대생들은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을까> <서울대를 꿈꾸는 초등학생 부모가 꼭 알아야 할 77가지> 등등.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책이 있었는데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거였어요. 현직 대학교수가 쓴 책인데 그분이 내린 결론은 젊었을 때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이익이라는 거였어요. 서울대라는 간판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맹목적인 우상이 되었으면 이런 책까지 나오나 싶어 숨이 막히더라고요.”
김교수는 우리나라에 중등교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부정한다. 그런데도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야말로 교육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차라리 그가 붙이고 싶은 용어는 ‘학벌 카지노’다. 학교는 3년간, 아니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명문학벌 취득이라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곳일 뿐이다. 학생들은 정규 카지노뿐만 아니라 사설 카지노까지 출입하면서 대박 터뜨리는 요령만 배울 뿐이라는 것. 한순간에 대박과 쪽박이 결판나듯 한순간의 시험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냉혹한 이치로 보나 대박 한번 터뜨리면 평생이 보장되는 현실을 볼 때 카지노판이나 현 입시제도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사람은 생긴 모습이 제각각이듯 능력도 제각각입니다. 학력이나 학벌에 의해 평가되지 않는 무한한 가능성은 누구나 갖고 있죠. 자신의 가능성을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쯤 되어서야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도 오지선다형이라는 일률적인 시험으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교육 시스템이 안타깝죠. 저는 요즘 열풍처럼 부는 조기유학은 곧 우리 교육에 대한 파산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것들이 엄마가 보고 싶어 눈물지으면서도 한국학교는 싫다며 떠나는 모습은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갈수록 조기유학 열풍이 부는 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파산 선고라고 생각한다는 김동훈 교수.
그나마 ‘금메달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패자부활전의 성격을 띠고 도전했던 것이 고시였다고 하는 김교수. 많은 비명문대생들이 고시합격을 통해 일류 학벌의 열등감을 어느 정도 떨쳐버리는 역할을 했지만 고시 합격자가 늘면서 몇몇 대형 법률회사에서는 오로지 서울대 출신만 채용하는 것을 불문율로 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 대기업도 명문대 출신만을 상대로 비공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적도 있고 지방대 졸업생은 아예 명함도 못 내미는 게 우리의 현실.
그래서 김교수는 서울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
“제가 말하는 서울대는 굳이 서울대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국립’이라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국립서울대학교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국가가 만든 슈퍼 명문대학입니다. 모든 조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며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을 싹쓸이하여 엘리트 파벌을 조성하고 뭇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 서울대에 들어가려고 기를 쓰는 거고요. 아무리 명문 사립대라 할 지라도 서울대와 맞붙으면 그야말로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와 중복 합격한 학생들은 자신이 전공하고 싶은 분야와 상관없이 일단 서울대 간판을 쫓아가죠. 이는 막강한 힘을 가진 국립대학이 사립대학의 기를 꺾어놓는 것으로 결국 우리 교육의 발전에 걸림돌만 될 뿐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수준 높은 고등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민의 세금을 축내가며 슈퍼공룡대학을 만든 것도 문제지만 그 무지막지한 공룡 하나가 모든 대학 위에 군림하면서 일류학벌 병을 만들어내고 이 땅의 모든 학생들과 부모를 괴롭히는 것이기에 국립서울대학은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는 것.
반면 김교수가 제시하는 건 미국의 아이비 리그 같은 명문군을 형성하는 것이다.
“어느 대학을 가도 학벌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대학 10개 정도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로 경쟁해 나가면 대학입시 경쟁의 압력이 10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그안에서 각자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를 공부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독불장군인 국립서울대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주장을 펼치는 김교수를 두고 간혹 ‘당신은 어느 대학 출신이냐,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니냐’는 소리도 듣긴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 스스로가 이미 학벌에 대한 껍데기를 훌훌 벗어버렸기에 그런 질문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마흔이 넘었지만 늦은 결혼으로 현재 네살배기 아이를 두고 있는 김교수는 “애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가능하면 웃게 만들고 싶어요. 아직 시기가 안돼서 그런가요? 내 아이에 대한 특별한 교육 방침은 없지만 아이의 자율 의사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라며 멋쩍은 웃음을 보인다. 아울러 “내 아이를 위해서도 이런 교육 풍토를 바꾸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는 2000년부터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goodbyehakbul.org)’ 모임을 결성해 지금껏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추천 0
-
댓글 0
- 목차
-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