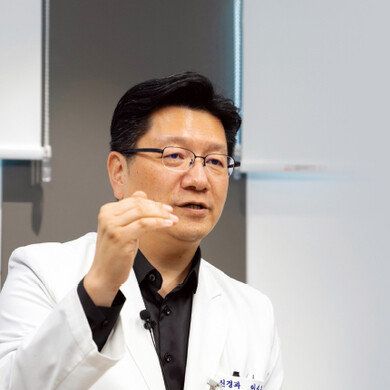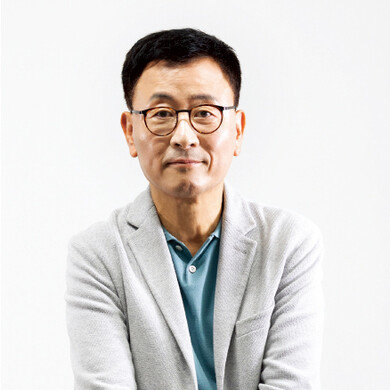18년 전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아들에게 아이비리그 학교를 보여주러 떠난 미국 여행. 여행 중 펜실베이니아 주의 작은 도시 뉴 호프에 들렀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처럼 앤티크 숍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우연히 퀼트 숍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 들어가니 할머니 한 분이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반해 오영실씨(55)는 퀼트와 사랑에 빠졌다.
“젊은 사람이 퀼트를 하고 있었다면 별 감흥이 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돌아와 퀼트를 배웠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다. 그러나 아들의 대학 진학 이후 삶이 무료해졌다. 그런 그에게 남편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니 소일한다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해보라”며 작은 숍을 열어줬다. 그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7년, 신사동 가로수길로 옮겨 2년, 그리고 종로구 계동 한옥에서 2년간 숍을 운영했다. 퀼트를 시작하기 전에도 요리와 꽃꽂이를 배웠지만 퀼트만큼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없었다.
“퀼트는 똑같은 패턴으로 만들어도 천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품이 나와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매력으로 다가왔죠. 수많은 천의 종류와 색을 보면 행복해요. 새로운 천을 만날 때마다 ‘저 천으로는 이런 작품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라 가슴이 두근거리거든요.”
그는 퀼트를 만난 뒤 온전한 자신을 발견해 행복했다.
“제가 연인을 만난다거나, 명품이나 값비싼 보석을 가진다고 설레는 마음이 계속될까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시간은 많아도 효과 있게 쓰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예쁘게 명품으로 차려입고 가는 곳은 레스토랑이나 커피숍밖에 없어요. 남에게 내가 누구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단순히 옷차림뿐인 거죠. 저는 이 나이에 가슴을 벅차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해요.”
재봉틀로 하는 머신 퀼트가 아닌 손으로 만드는 핸드 퀼트를 하면서 삶의 방식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손바느질을 통해 느림의 미학을 알게 된 것. 그러면서 자연스레 그의 삶도 아날로그적으로 변했다.
“핸드 퀼트가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10여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머신 퀼트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4~5년 전부터 퀼트 문화가 바뀌었죠.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를 해야 하니 여유가 없고, 숍을 운영하는 선생님들도 시간이 없으니까 재봉틀로 수업을 하게 됐죠. 빨리 끝나니까요. 하지만 손바느질은 재봉틀로 하는 퀼트와는 느낌부터 달라요.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핸드 퀼트의 매력을 잃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죠.”
오영실씨는 아날로그적 삶을 살기 시작하며 오히려 더 바빠졌단다. 인터뷰하던 날 저녁에는 경기도 이천 집에 내려가 배추를 뽑아 김장을 해야 한다며 웃었다. 그는 직접 기른 제철 채소를 이용해 장아찌를 담그기도 한다고. 바쁘게 사는 그에게 사람들이 수업도 많고 작품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하냐고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이제까지 서울 토박이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전원생활을 시작했죠. 직접 채소를 길러 먹고, 장도 담가 먹으니 자연스럽게 몸이 건강해지더라고요. 저는 서울과 이천을 오가지만 차가 없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뚜벅이’로 살아요. 그것도 몸이 건강해지는 이유라 생각해요”
몸은 고달프나 머릿속 걱정이 사라져
더디 사는 데 익숙해진 그는 요즘 사람들의 메마른 삶이 안타깝다고 한다. 얼마 전 고속버스 안에서 한 커플을 보았는데, 그들은 대화는 하지 않고 각자 아이패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디지털화한 사람들은 자기 공간 속에서만 살아요. 하지만 아날로그적으로 살다 보면 자연과도 교류할 수 있고, 사람과도 교감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편하고 빠르다는 이유로 인터넷 쇼핑을 하잖아요? 하지만 직접 숍에 한번 가보세요. 그곳에서 자신이 쓸 물건을 보고 고르는 과정에서 물건과 교감할 수 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그는 손바느질을 추천했다. 조선시대 규방 공예가 이어져 내려온 것도 바로 그 이유에서라고.
“옛날에 규수들이 괜히 바느질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도 힘들었잖아요. 바느질을 하면 마음을 비워야 하니 머릿속이 당연히 깨끗해지죠. 걱정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내 손으로 우리 가족이 쓸 물건을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는 얼마 전까지 한옥에서 작업실 겸 숍을 운영했고 2009년 말,‘내가 꿈꾸는 집, 한옥’이라는 책도 냈다. 그러나 한 달 전 한옥 생활을 정리했다.
“한옥에서 1주일에 3일 정도 살았어요. 이천 집을 오가며 숍과 작업실을 운영하는 데 힘이 많이 들더군요. 신경 쓸 것도 많았고요. 혼자 하기는 벅차 선생님과 직원을 뒀었죠. 어느 날 제가 한옥에서 누리는 것들이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을 무척 좋아해주셔서 미련도 남았죠. 하지만 그간 한옥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더는 욕심 부리지 않기로 했죠.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즐길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고민 끝에 창덕궁 옆 좁은 골목에 있는 3층짜리 자그마한 붉은 벽돌집으로 이사했다. 욕심을 버리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회원들만 가르치기 위해서다. 자신의 작품을 좋아해주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디 있든지 찾아올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건물을 둘러싼 벽돌만 그대로 두고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내부 하나하나를 직접 고쳤다. 1층에는 전시 공간, 2층에는 수업을 열 수 있는 작은 공간, 3층에는 그만의 작업실을 만들었다. 소품 하나하나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는 그 공간을 만들며 미래도 함께 고민하게 됐다고. 그는 이렇듯 자신의 삶을 계획해나가는 것이 즐겁다고 했다.
“북촌에는 실력 있는 젊은 수공예 작가들이 많아요. 하지만 마땅히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곳은 부족하죠. 저희 집 1층에 공간이 있으니 앞으로는 그곳을 빌려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수공예 작가들과 함께 프리 마켓도 열 생각이에요.”

-
추천 0
-
댓글 0
- 목차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