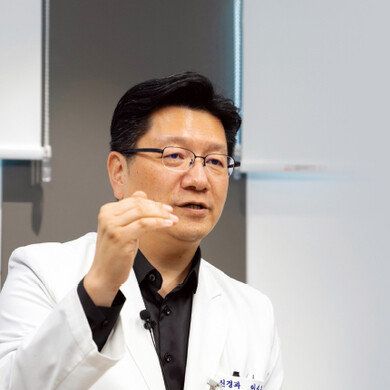“얘는 온몸이 하얗기 때문에 ‘설탕’이고요. 이 친군 털의 얼룩이 마치 낙서해 놓은 것 같아서 ‘낙서’, 이 시커먼 놈은 ‘타잔’이에요. 타잔처럼 씩씩하냐고요? 어휴, 말도 마세요. 얼마나 겁쟁인데요. 그리고 이 놈은 먼지 같은 털색깔 때문에 ‘먼지’, 저 놈은 줄무늬가 있어서 ‘줄티’….”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 어느 놈이 강아지고 어느 놈이 고양이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데, 김은주씨는 재빨리 한놈 한놈 가리키며 이름을 가르쳐주느라 정신이 없다.
얼추 모두 모였겠지, 싶었는데 아니다. 방안 구석구석에서 한 마리씩 자꾸 나타난다. 귀가 접힌 아줌마 고양이 무단은 너무 새까만 털 덕분에 가장 늦게 발견됐다. 희한한 점은 열네마리라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의 동물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란스럽지가 않다는 사실이다.
강아지 한 마리가 열네 마리의 대식구로 불어나게 된 사연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나 개를 길렀던 터라 자연스럽게 기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기르기 시작한 놈이 바로 타잔(슈나우저)이에요. 그러다 타잔이 심심할 것 같아서 친구 삼으라고 설탕이(페르시안 고양이)를 데려왔는데, 키워보니까 고양이 키우는 맛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를 더 데려왔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가 소외되는 것 같아서 또 개를 한 마리 더 데려오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대가족이 모인 거죠.”
물 붓다보니 싱거워서 간장 더 붓고, 그랬더니 짜서 물을 더 부었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약간은 황당한 이유로 불어나게 된 식구들. 그러나 이유야 어쨌건 슈나우저, 요크셔 테리어, 닥스훈트(이상 강아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안, 아메리칸 쇼트헤어, 러시안 블루, 샴(이상 고양이)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혈통의 다양한 강아지, 고양이들이 한집안에 모여 살고 있는 건 그리 흔한 풍경은 아니다.
3년여 동안 조용히 불어난 식구들 때문에 김씨는 본의 아니게 ‘독립’을 감행하게 되었고, 조용한 주택가에 이렇듯 강아지와 고양이들만의 독립 왕국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20여평 되는 집안은 철저히 동물들을 위한 공간이다. 활동공간을 조금이라도 넓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구를 최대한 없앴다. 김씨의 공간이라고 할 만한 곳은 침실로 쓰고 있는 한평짜리 방한칸 뿐. 나머지 안방과 거실, 부엌과 베란다는 물론 욕실을 포함한 모든 공간이 순전히 ‘그들만의 리그’라니, 주객이 전도돼도 보통 전도된 게 아니다.
키우는 재미야 쏠쏠해도 정작 생활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김은주씨의 생각은 좀 다르다.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살기엔 집이 좁을 것 같아도 자기들끼리 규칙과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좁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흔히 개와 고양이는 앙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예요. 저 역시 이 친구들이 아무리 복닥거려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하고싶은 일 다하면서 지내는 걸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 안보고 편하게 산다는 말이 가장 적당할 것 같네요.”
아무리 그래도 이 대식구들을 먹이고 씻기는 것만으로도 ‘처녀가장’의 마음이 무거울 법한데, 김씨는 천연덕스럽기만 하다.
“책임감 때문에 모두 끌어안고 사는 건 결코 아니예요. 같이 사는 게 정말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내는 거죠.”

결혼도 안하고 애완동물만 애지중지하다보니 ‘독신주의자 아니냐’는 오해도 많이 받는다고.
애완동물을 기르다 보면 누구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게 마련.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새끼 고양이에 얽힌 일화 역시 그렇다. 갓난 새끼를 자꾸 밀쳐내는 어미 고양이 때문에 새끼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자, 김씨는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모두 회사에 데리고 가기까지 했다고. 일하다 말고 두 시간에 한번씩 우유를 먹이는 응급조치로 간신히 살려냈다고 한다. 워낙에 대식구이다 보니 자식 양육은 어미에게 일임하는 룰을 지키고 있지만 간혹 긴급상황에 처할 때면 김씨 자신이 누구보다 극진한 어미로 돌변한다. 그녀의 강아지, 고양이 사랑은 이미 회사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 물론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
“하루는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방 한가운데서 고양이가 죽어있는 거예요. 다른 녀석들은 모두 주변을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고요. 대체 왜 죽었는지 영문을 모르겠어요. 그 일로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죠.”
그 날 세상을 떠난 고양이 ‘하구하구’는 지금 고운 뼛가루가 되어 거실 선반 한 귀퉁이 항아리 속에 생전의 모습을 찍은 스냅사진과 함께 남아있다. ‘하구하구’란 이름은 얼마 뒤 이 집에 들어온 수컷 스코티시 폴드 고양이가 이어받았다.
김씨가 동물을 좋아하는 건 그들만의 평화로운 공존방식을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 공간을 나눠서 쓰는 특성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다툼이 거의 없고 평화롭게 질서를 유지한다고 한다.
“동물들은 웬만하면 안 싸워요. 욕심도 많지 않은데다 참을성도 많죠. 규칙을 지키며 서로 속상해 할 일을 만들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런 단순함과 소유에 대한 욕심 없음을 볼 때마다 참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을 해요. 전 이 친구들을 기르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 친구들과 함께 자라고 성숙해 간다는 생각도 합니다.”
항간에선 값비싼 외국산 고양이들을 키우는 것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좀더 행복해지기 위해 투자한 것뿐이다. 한달에 동물 식구들 사료값으로 들어가는 돈을 아끼기 위해 다른 지출을 아끼다 보니 오히려 알뜰해지는 습관까지 덤으로 얻게 되었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애완동물만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 “독신주의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김씨는 “그렇지는 않다”고 말한다. 마당 있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금의 동물 가족들이 함께 뒹굴며 즐겁게 사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애완동물을 길러보고 싶은 이들에게 김씨가 전하는 귀띔 하나.
“우선 키우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그냥 친구로 사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하는 것이 좋죠. 간혹 보면 어릴 때는 예뻐하다가 나중에 커지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기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요.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어느 정도는 자기 인생을 주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해요. 그 동물의 생을 저당잡고 있으니만큼 우리 역시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해야죠. 그래야 책임감 있는 주인이라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개는 개답게,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기르라고 한다.
“이 세상에 사랑은 여러 형태로 오는 것 같아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집착과 애증을 상대에게 안겨주기도 하잖아요? 혹은 너무 무책임한 사랑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친구들을 보면서 ‘건강한 사랑’을 느껴요. 집착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고, 늘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니까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창틀에서 스르르 낮잠 자다가 동그란 눈을 떠 자신과 눈을 맞추는 고양이들을 볼 때, 그리고 짧지만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나갈 때마다 깡총깡총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즐거워하는 강아지들을 볼 때 행복을 느낀다는 김은주씨. 자신이 이렇게 행복한 만큼 강아지와 고양이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이며 이렇게 반문한다.
“이렇게 작은 기쁨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한식구 아니겠어요?”
-
추천 0
-
댓글 0
- 목차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