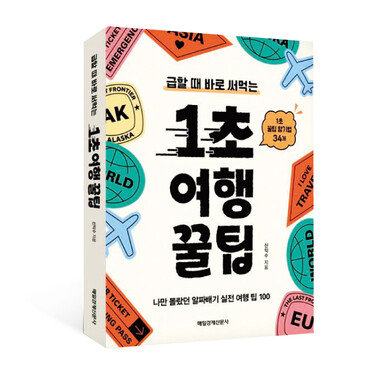불자와 이야기를 나누시며 활짝 웃고 있는 스님의 모습이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 스님은 절(寺) 가운데 최고는 친절(親切)이라고 말씀하셨다. 스님의 웃음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친절이 아니었을까.
법정 스님을 7년 남짓 찍은 것은 ‘인연’이었다. 취재차 방문한 길상사에서 이뤄지는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 블로그에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그 시작이었다. 당시 길상사에 대한 지식은 ‘절이 되기 전 요정이었고’ ‘법정 스님이 시주를 받아 만들었다’는 것뿐이었다.
길상사 안팎의 사진을 찍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먼발치에서 법정 스님을 처음 뵈었다. 그것도 신도 한 분이 귀띔을 해주어서 알아챘다. 일요일 점심 공양 때라 불자들이 꽤 오가는 경내에서 ‘저분이 법정 스님이다’라고 가리켰지만 밀짚모자에 안경까지 쓴 스님을 첫눈에 알아보기란 쉽지 않았다. 스님의 동작이 빨라서 찍지도 못했다.
블로그 ‘우리세상’에 스님의 모습이 처음 올라간 것은 사진공양을 시작한 지 넉 달이 지났을 때였다. 가을 정기법문을 마친 스님이 경내를 한 바퀴 돌 때 높은 데서 망원렌즈로 찍은 사진인데 스님은 그때 내가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아셨는지 날카로운 눈빛을 한 번 건네셨다. 스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만약 인파가 없었더라면 나는 그 눈빛에 겁을 먹어 사진을 찍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다행히 스님은 신도들이 건네는 인사를 받으시느라 경황이 없어 나는 계속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일여, 자네는 별 걸 다 찍네”
날카로운 스님의 눈빛…, 내게 남아 있는 스님의 유산 가운데 하나다. 만약 스님의 눈빛이 없었더라면 나는 스님을 찍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내 안의 죽비이자 사진 공양을 지탱하게 하는 다른 날개였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으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눈빛을 주셨다. 스님과 나만이 아는 신호가 오면 나는 주저 없이 물러나왔다. 눈빛이 무서웠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실 땐 ‘원래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스님은 편찮으시기 전까지 일 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길상사에 오셨다. 스님 오시는 날이 용케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날일 경우 나는 길상사 행지실 한구석에 앉아 스님을 찍었다. 법문을 하시기 전 약 10~20분 정도가 고작이었는데 행지실의 좁은 방안에는 스님을 뵈러 온 불자들도 넘쳐났다. 스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마디씩 건네셔야 했기 때문에 내게는 “차나 한 잔 하고 찍어라” 또는 “어이, 일여(一如, 당시 길상사 주지이셨던 덕조 스님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절에 와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지어주신 내 법명), 신문사는 어떤가”라고 물으시는 정도였다.
사람들이 없을 땐 스님께 궁금한 것을 여쭤보기도 했다. 한번은 “스님 글을 보면 인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인용구를 어떻게 일일이 기억하십니까”라고 여쭙자 “응, 메모를 하지”라고 대답하신 적이 있었다. “메모한 수첩이 꽤 많으시겠네요”라고 다시 여쭙자 미소만 지으셨다.
스님은 전남 순천 송광사 불일암에서 17년, 강원도 수류산방에서 17년을 사셨다. 강원도 기간은 길상사 10년과 겹친다. 내가 스님을 찍은 7년간은 스님의 말년에 해당되는데 스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 아쉽다. 스님의 책에 무수히 언급된 홀로 사는 스님의 일상이 내 사진 속에는 없다.
나는 스님의 일상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두 번쯤 올린 적이 있다. 한 번은 길상사 행지실에서였고 또 한 번은 스님께서 만든 사회단체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의 표지 글을 통해서였다. 스님은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셨다. 아무 말씀도 없으시기에 내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긍정의 표시라는 생각이 든다. 몇 가지 ‘오해’의 근거가 있다.
첫째, 스님은 카메라 기피증이 있다 해도 될 만큼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하셨다고 한다. 스님의 글을 통해 많은 이들은 위로를 받았지만 오히려 당신은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셨다. 책을 읽고 불일암을 관광지나 되는 양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자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불일암을 떠나셨다. 이런 어른이 두 번이나 거듭된 촬영 요청에 즉답을 주시는 대신 “기자라 그런가. 일여는 별 걸 다 찍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이다.
스님이 내 카메라를 회피하지 않자 신도들이 강원도 생활을 한번 찍어보라고 권유했다. 그래서 스님의 글을 근거로 강원도 오두막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다. ‘오두막에서 얼마 되지 않은 거리를 달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맛있는 국수를 먹었다’ 등등을 바탕 삼아 스님의 처소는 고속도로에서 멀지 않은 강원도 어디쯤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내 짐작이 맞는지 ‘맑고 향기롭게’ 김자경 실장에게 “‘강원도 ○○○에 계시는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 헛걸음할지도 모르니 정확히 알기만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사진을 찍을 텐데”라고 혼잣말을 하며 반응을 떠본 적도 있었다. 한데 김 실장이 “이 기자가 스님 처소를 찾아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며 나의 뜻을 스님에게 대신 여쭌 모양이었다. 스님은 웃으시면서 “한번 찾아보라지. 내 아지트가 어디 한둘인가. 절대 찾지 못할 거야”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그 의미는 “찾지 못할 것이다”에 있었지만 “찾아오면 내치지는 않겠다”라는 속마음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 날 세운 행전(종아리에 차는 헝겊)에서 법정 스님의 올곧은 성정이 엿보인다. 스님은 1년에 두 번 있는 길상사 정기법회를 위해 준비할 일도 많으셨을 텐데 이 행전을 당신 몸에 지니기 위해 새벽잠까지 줄이셨을 것이다. 사진을 찍기 달포 전 스님이 기침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걱정을 했다. 하지만 이날 스님의 걸음걸이는 마치 ‘일여, 나 오래 살 테니 걱정 마’ 하고 몸짓으로 전하시려는 듯했다.
※일여(一如) :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길상사에 와 사진을 찍는다고 주지 스님이셨던 덕조 스님이 지어준 불명(佛名)

스님의 손에 쥐어진 찻잔과 안경. 스님의 삶을 말해주는 것들이다. 세상에 글로 알려진 스님이지만 손은 유약하기보다는 노동에 단련된 것처럼 억셌다. 스님 삶이 어떠했는지 그 손이 말해준다. 찻잔과 안경은 당신 삶이 어디서 위로받았는지를 알게 해준다. 차와 책을 가까이하셨던 스님께 이들은 맑은 가난의 친구들이었다.
행전, 안경, 찻잔… 맑은 가난의 친구들
내가 찍은 스님의 뒷모습에는 스님의 건강했던 시절과 그렇지 않은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다. 건강했던 시절의 뒷모습에서는 급한 성정이 보이지만 기력을 잃었을 때의 뒷모습에서는 지금껏 지고 온 삶의 무게가 힘겨운 느낌이 묻어난다. 스님은 사람의 앞모습에는 오관(五官)이 모여 있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은연중 나타나 뒷모습에 비해 덜 순수하다고 하셨다. 나는 맑은 느낌의 스님, 좋은 인상의 신자를 봤을 땐 얼굴과 눈보다는 신체의 일부를 클로즈업해 그것들을 표현하고자 했다.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가진 ‘자루의 무게’는 그의 손이나 발 등 극히 일부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문을 통과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얼굴을 찍을 것인지 신체의 일부를 통해 느낌을 표현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뒷모습은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표현 대상이었다.
신체 일부에서 스님만의 그 무엇을 잡아내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다. 아는 만큼 보인다더니 스님을 알면 알수록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진은 내 입으로 말하기엔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두세 장에 불과한 것 같다.
한 장은 2007년에 찍은 빳빳한 행전 사진이고 다른 한 장은 2008년에 찍은 스님이 안경과 찻잔을 들고 있는 것을 클로즈업한 사진이다. 또 다른 한 장은 스님의 법구가 당신이 만든 대나무 평상에 누워 가사 한 장 덮은 채 송광사의 개울을 건너는 모습이다.
빳빳한 행전은 당신 생애 내내 하고 다니셨다. 2004년 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도 스님은 검정색 행전을 풀 먹여 두르고 다녔지만 눈에 들어온 것은 4년이나 지난 2007년 겨울이었다. 왜 그리 늦게 눈에 들어왔는지 모른다. 당시 행전이 날카로운 스님의 눈빛과 어쩌면 저렇게 닮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언행일치의 산물 중 하나가 행전이라고 생각한다. 행전은 종아리와 신발 사이에 차는 것으로, 차도 되고 안 차도 되는 데다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행전은 작았지만 그것에 스님의 꼿꼿한 성격이 있었다.

2008년에 찍은 안경과 찻잔을 들고 있는 사진에는 스님의 일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먹물의 가사는 수행자를, 억센 손은 노동에 익숙했음을, 안경과 찻잔은 책과 글이 친구임을 느끼게 한다.
스님은 2010년 3월13일 ‘미리 쓰는 유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떠나셨다. 대나무 평상에 누워 낡은 가사를 덮고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과 가장 가까운 상태인 채 송광사 개울을 건넜다. 개울을 건너는 스님의 법구에 스님의 생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스님의 사진을 찍는 것은 내게 공부였다. 배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소중한 공부다. 배우며 스님을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다. 그것은 마음에 얼굴에 삶에 나타날 것이다.

1 법문 시간이 다가올 때 법정 스님이 행지실에서 맨 처음 하시는 일은 행전을 매는 것이었다. 법정 스님은 옷의 가장 작은 부분인 행전까지도 소중히 다루셨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행전은 항상 그렇게 스님과 함께 있었다.
2 이날 법문을 하러 가시는 스님의 발걸음은 노래라도 부르러 가는 듯 가볍고 활기찼다. 발걸음이 가벼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께서 창건하신 길상사가 ‘맑은 가난’을 구현하는 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 그것을 실천할 불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 즐거웠기 때문이 아닐까.
3 날카로운 스님의 눈빛,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만약 스님의 눈빛이 없었더라면 나는 스님을 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찍을 수 없었을 것이다.
■참고도서·‘비구, 법정法頂’(동아일보사)
-
추천 0
-
댓글 0
- 목차
- 공유